9만 명 이공계 대학원생을 ‘특허 인재’로…미래를 여는 씨앗 심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탱할 힘은 어디에서 올까. 끊임없는 도전과 연구를 이어가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들의 연구 성과가 특허라는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대부분은 교수 연구과제의 일부로 이름을 올리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새롭게 출범한 지식재산처가 나서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아이디어 발굴에서 특허 출원, 활용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대학원생이 직접 경험하도록 체계적인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 단순한 강의나 이론 교육이 아닌 “직접 해보는 경험”이야말로 최고의 배움이기 때문이다.
특허 교육, 경험으로 완성되다
현재 일부 대학원에 ‘특허 수업’이 존재하지만, 실제 출원과는 괴리가 크다. 선행기술 검색이나 명세서 작성법을 배우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진짜 교육은 직접 특허를 출원해 보는 과정 속에 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AI)을 연구하거나 활용하는 대학원생들이 많지만, 그들의 아이디어가 특허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기술은 논문에만 머물고 만다. 직접 특허를 출원하면 기존 기술의 한계를 체감하고, 새로운 기술을 자신의 언어로 묘사하는 힘을 기르게 된다. 이는 곧 연구자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국가 기술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
예산의 벽, 국가가 함께 넘을 때
문제는 비용이다. 특허를 출원하려면 출원료·심사료·등록료는 물론 매년 연차료까지 부담해야 한다. 대학원생에게는 너무 큰 짐이며, 대학 차원에서도 감당하기 어렵다. 실제 국내 주요 대학들의 특허 예산은 연구개발비의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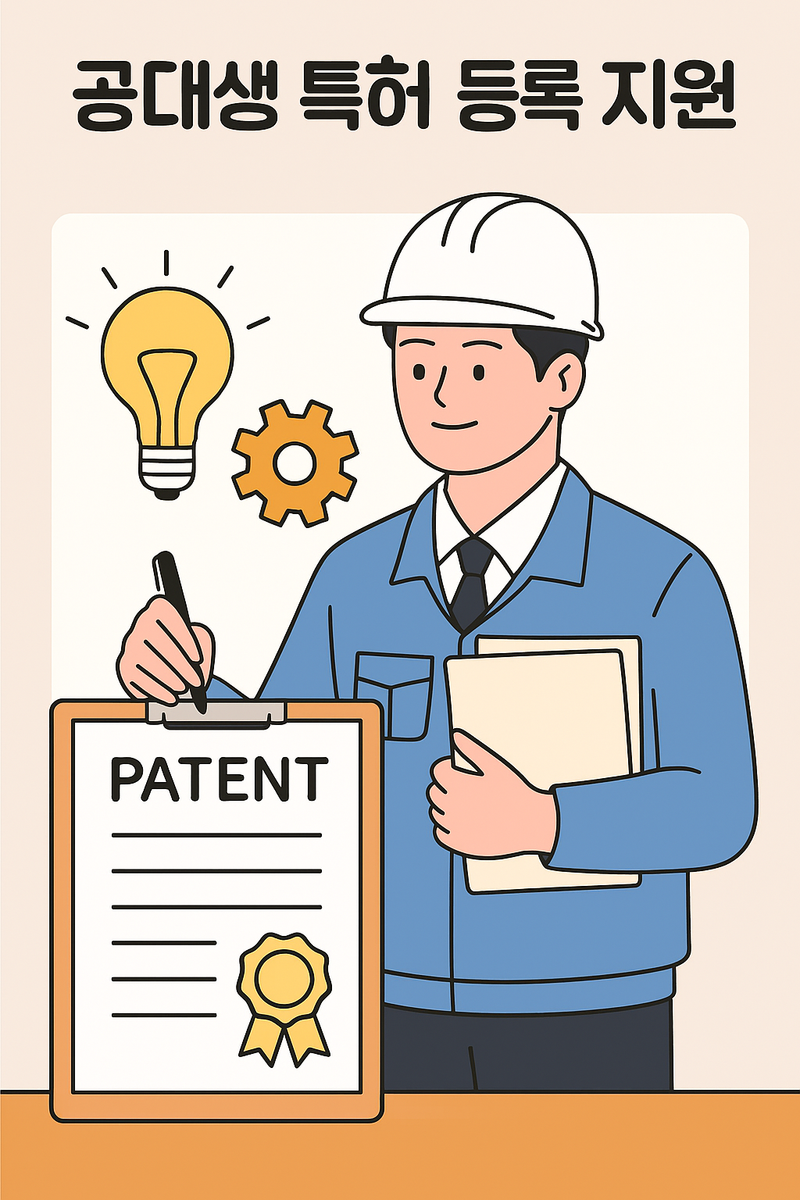
따라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 현재 국내 이공계 대학원생은 약 9만 명. 모든 학생이 1건씩 특허를 출원할 수 있도록 출원료와 최초 5년간의 유지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면, 연구 의욕을 북돋는 동시에 산업적 성과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다.
인재와 특허, 서로를 키우는 두 날개
특허 출원 경험은 학생들에게 단순한 제도가 아닌 “삶을 바꾸는 배움”이 될 수 있다. 명세서를 직접 쓰고 청구 범위를 고민하는 순간, 연구자는 기술의 본질을 더욱 깊이 이해한다. 또한 자신의 발명이 사회와 산업을 윤택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실감하며 연구의 사명감을 다진다.
한 시대를 움직이는 힘은 결국 인재에게서 나온다. 그리고 그 인재는 특허라는 실질적 성과를 통해 더욱 단단히 성장한다. 특허가 인재를 키우고, 인재가 특허를 풍성하게 하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할 때다.
“씨앗은 지금 심어야 한다”
지형근 삼성물산 부사장이 강조했듯, 나눔과 기부가 삶 속 습관이 될 때 사회가 따뜻해지듯이, 특허 출원 또한 대학원생의 일상이 될 때 우리 사회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
9만 명 이공계 대학원생이 모두 특허 발명자가 되는 날, 대한민국은 더 이상 뒤쫓는 나라가 아니라 앞서가는 나라로 서 있을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 씨앗을 심어야 할 순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