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칼럼 / 칭찬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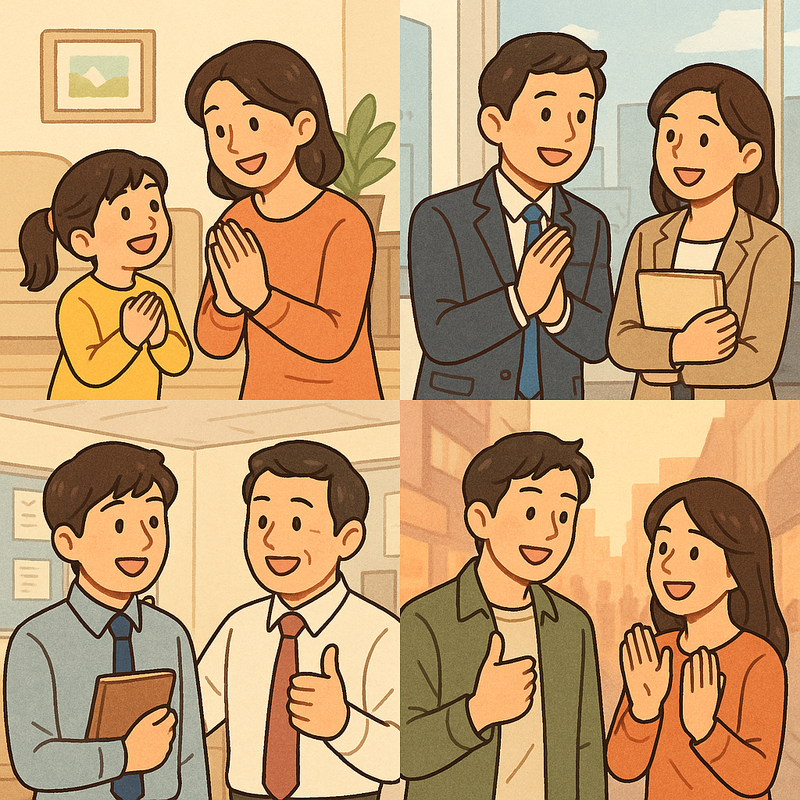
• 왜 우리는 칭찬에 서툰가 — 말보다 마음이 앞서는 문화의 그림자
‘별거 아니에요.’ ‘제가 한 게 뭐 있나요.’
누군가 칭찬을 건네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손사래를 친다. 겸손의 미덕이라 부르지만,
그 속에는 진심을 받아들이는 어색함과 표현의 서툼이 깔려 있다.
왜 한국인은 칭찬 앞에서 움츠러들까?
■ 겸손의 미덕과 자기 절제의 언어
한국어는 기본적으로 ‘겸양의 언어’다. 상대의 체면을 세우고 나를 낮추는 것이 예의로 여겨진다. ‘고맙습니다’보다 ‘별말씀을요’가 더 자연스러운 이유다. 이는 언어 구조에 깊이 배어 있는 사회적 위계와 관계 중심의 사고에서 비롯된다.
영어권에서 Good job, 또는You’re amazing! 같은 칭찬은 자연스러운 대화의 일부이지만, 한국어에서는 과장이나 거만으로 오해받기 쉽다.
우리는 칭찬을 받으면 즉시 겸손의 응답을 찾아야 한다는 무의식적 부담을 느낀다.
이러한 언어 습관은 칭찬은 자만을 낳는다는 유교적 사고와 맞닿아 있다.
말로 드러내는 칭찬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평가가 중시되며,
과한 표현은 삼가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이 오랫동안 지속돼 왔다.
■ 집단의 조화, 개인의 절제
우리의 칭찬 문화는 집단 중심의 사회 구조 속에서 형성됐다.
조선시대 유교문화는 개인보다 공동체의 질서를 우선시했고,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전체의 조화를 유지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았다.
이 때문에 ‘잘난 척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존재로 여겨졌고, 칭찬 또한 개인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위험한 언어로 여겨졌다.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라는 속담이 말해주듯,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겸손과 절제를 최고의 미덕으로 여겼다.
또한 일제강점기와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국민들은 성과보다 노력과 희생을 강조하는 집단 의식에 익숙해졌다.
누군가의 성공을 칭찬하기보다, ‘모두가 함께 고생했다’는 메시지를 나누는 것이 더 편했다.
결국 칭찬은 개인의 차이를 드러내는 행위, 즉 사회적 불편을 유발할 수 있는 감정 표현으로 자리 잡은 셈이다.
■ 칭찬은 경쟁 아닌 격려
반면 서구 사회나 일부 선진국에서는 칭찬을 관계의 윤활유로 본다.
미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Great work!, You did your best! 와 같은 긍정적 피드백이 자연스럽게 교육된다.
이는 개인의 자존감을 높이는 동시에 동기 부여의 도구로 활용된다.
일본은 한국과 비슷한 유교문화권이지만, 최근 들어 호메루(褒める, 칭찬하다)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학교와 기업에서는 ‘칭찬은 가장 저렴한 투자’라는 말이 유행하며, 관리자는 구성원에게 구체적이고 진심 어린 칭찬을 하도록 교육받는다.
북유럽에서는 ‘칭찬의 언어’가 공동체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수단이다. 덴마크의 교사들은 학생에게 ‘틀렸지만 좋은 시도였다’고 말하며 실패 속의 가치를 인정한다.
이처럼 외국의 칭찬 문화는 개인의 성장을 돕는 건설적 소통에 초점이 있다. 칭찬은 자존심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대화의 시작점인 것이다.
■ 진심보다 계산된 칭찬
오늘날 한국 사회의 칭찬은 종종 전략적이다. 직장에서의 칭찬은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학교에서는 점수나 평가와 연결된 조건적 언어로 쓰인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 고래가 진짜로 날 춤추게 하려는 건가? 를 의심하는 경우가 많다.
진심 어린 칭찬이 드물어지니, 사람들은 오히려 칭찬을 경계하게 된다.
이런 불신의 구조는 결국 사회적 신뢰의 결핍으로 이어진다.
■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진심의 칭찬 문화’
이제 우리 사회도 칭찬을 ‘관계의 장식’이 아닌 ‘성장의 언어’로 재정의해야 한다.
첫째, 구체적으로 칭찬하자. ‘잘했어’보다는 ‘그 발표에서 자료를 명확히 정리한 점이 인상적이었어’처럼 행동의 이유를 함께 말하면 상대는 진심을 느낀다.
둘째, 수용의 언어를 연습하자. ‘별말씀을요’ 대신 ‘감사합니다. 더 잘해보겠습니다.’라고 답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는 자만이 아니라 자기 효능감을 키우는 표현이다.
셋째, 가정과 학교의 칭찬 교육이 중요하다. 부모가 자녀에게 ‘성적보다 노력하는 모습이 자랑스럽다’고 말할 때, 아이는 자신이 결과가 아닌 존재로 인정받는다는 확신을 얻는다.
넷째, 칭찬을 공유의 언어로 바꿔야 한다. 한 사람의 성취를 모두의 노력으로 연결하며, 함께 잘했다는 감정을 나누면 경쟁보다 협력이 강화된다.
■ 말 한 마디의 힘
칭찬은 공기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회의 온도를 바꾸는 힘을 지닌다.
한국인이 칭찬에 서툰 이유는 진심의 표현보다 체면의 조율에 익숙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시대는 감정의 온도가 곧 신뢰의 척도다.
누군가의 노력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그 마음을 말로 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성숙한 사회가 된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린다.’
이제 우리의 칭찬 문화도 그 한마디의 힘을 되찾을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