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시간의 문턱에 서 있는 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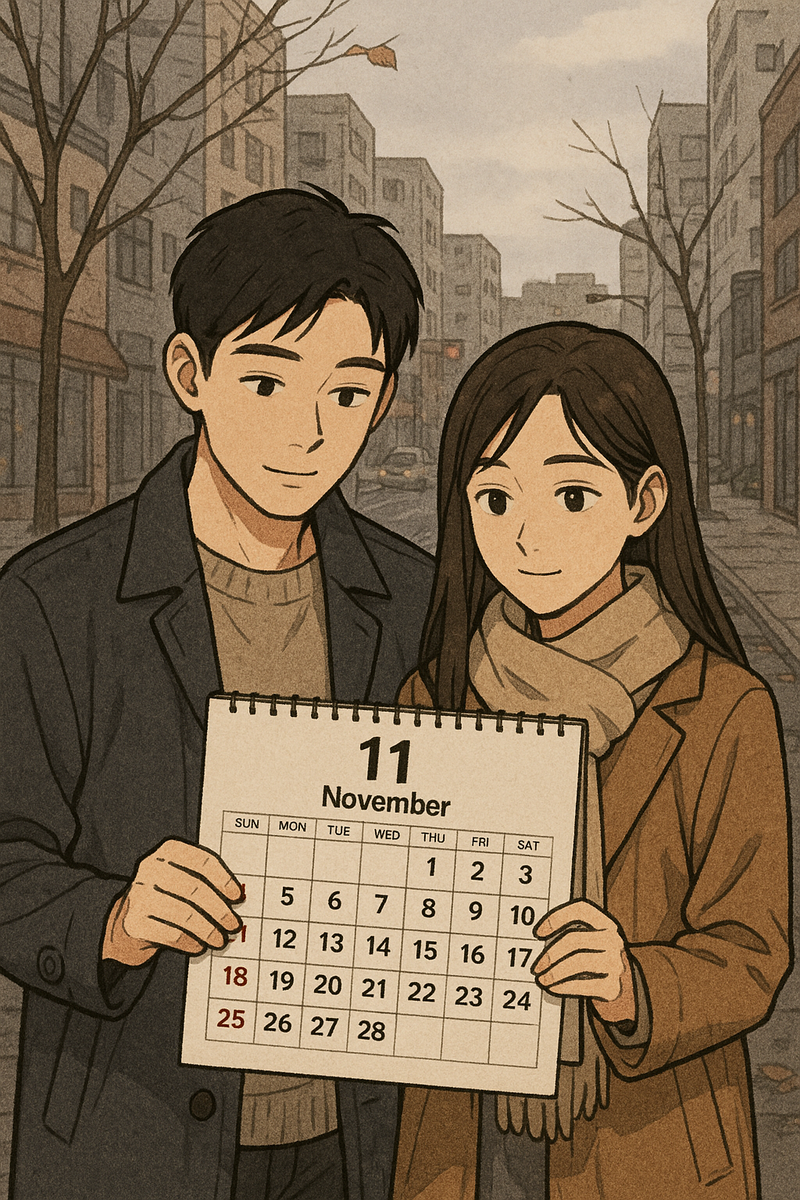
11월은 계절의 자락이 한 해의 끝으로 향하는 관문이다.
그래서 단풍의 붉음이 서서히 빛을 잃어가고, 낙엽이 쌓이는 거리에선 시간의 무게가 발끝에 달라붙는다.
11월의 공기는 가을의 여운을 간직하면서도 겨울의 냉기를 예고한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이 시기를 두고 ‘가장 쓸쓸하지만 가장 사색적인 달‘이라 부른다.
문학 속 11월은 흔히 기억과 회한의 계절로 그려진다. 김현승의 시 〈가을의 기도〉처럼 ‘내게 주신 이 가을의 의미를 깨닫게 하소서‘라는 구절은, 시간의 덧없음 속에서도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순간을 상징한다.
프랑스의 시인 보들레르 역시 ‘가을의 노래’에서 인간의 덧없음과 슬픔을 노래했다. 그만큼 11월은 계절이 아닌 감정의 상태로 존재한다. 들국화가 고개를 숙이고, 나무의 가지가 비어갈수록 사람들의 내면엔 사색과 정리의 감정이 스며든다.
문화적으로 11월은 마감과 준비의 달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연말 결산, 각종 예산 편성 등 사회의 리듬이 정리와 기대 사이를 오간다.
거리에는 이미 성탄 트리가 세워지고, 카페에는 따뜻한 음료가 늘어난다. 이는 단순한 소비 현상을 넘어, 한 해를 정리하며 위로를 찾는 연말 심리의 표현이다.
11월이 되면 유난히 사람을 그리워하고, 모임을 계획한다. 차가워지는 날씨 속에서 관계를 다시금 확인하고 싶은 욕구가 커지는 것이다.
또한 11월은 감정의 관성을 되돌아보는 시기이기도 하다.
긴 여름과 짧은 가을을 지나며 생긴 피로감, 일상의 속도에 대한 반성, 그리고 ‘내년엔 더 잘해보자’는 희망이 교차한다. 이때 우리는 흔히 단풍처럼 아름답게 지는 법을 배운다.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활발해지는 것도 이즈음이다. 기부와 봉사 캠페인이 늘어나고, 나눔이 자연스럽게 일상으로 스며드는 달이기도 하다.
예술 분야에서도 11월은 조용한 결실의 계절로 평가받는다.
공연예술계에선 가을 시즌의 마지막 무대가 오르고, 문학계에선 신인문학상이 발표된다. 영화관에는 잔잔한 감성영화가 걸리고, 전시장에는 빛과 그림자를 주제로 한 기획전이 많다.
이 시기의 예술은 여름의 화려함보다 삶의 깊이를 다루며, 마지막의 아름다움을 강조한다.
기후적으로도 11월은 흥미롭다. 낮과 밤의 기온 차가 커지고, 첫서리가 내리며 겨울의 초입으로 들어선다.
농촌에서는 추수가 마무리되고, 도시에서는 낙엽 청소가 시작된다. 이렇게 자연의 변화는 곧 인간의 감정 변화를 이끌어낸다.
시인 정호승이 ‘낙엽이 지는 건 끝이 아니라 새봄을 위한 준비‘라고 말했듯, 11월은 끝이자 시작의 동시성 속에 있다.
결국 11월은 멈춤과 준비의 달이다.
지나온 시간에 감사하며, 다가올 시간에 마음을 다잡는 달이다. 문학이 이를 고요한 결심의 달로, 문화가 이를 마음의 수확기로 불러온 이유도 같다. 잠시 멈추어 선 그 자리에, 삶의 의미와 다음 해의 길이 함께 서 있다. 그래서 11월의 쓸쓸함은 슬픔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고요한 쉼표다.
11월, 모든 것이 멈춘 듯하지만 사실은 새로움이 자라고 있다.
계절이 주는 가장 조용한 진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