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혁신의 발목을 잡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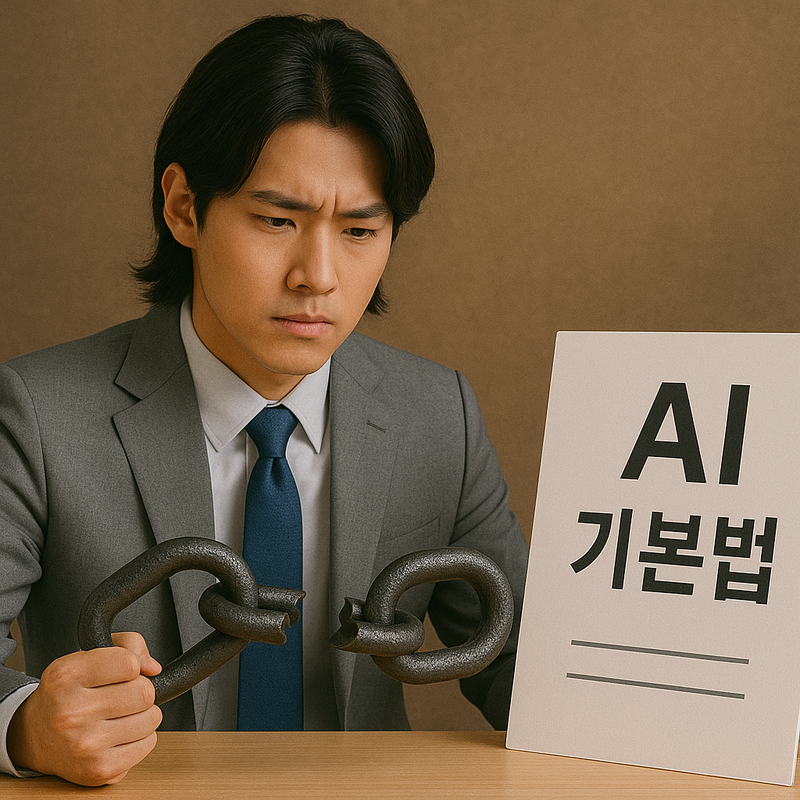
AI 산업이 세계적으로 급속히 발전하는 가운데, 한국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으로 인해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직접 선정한 국가대표 AI 정예팀까지 이 법안에 대해 “우리 발목도 잡을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정예팀의 경고 : 규제가 경쟁력 떨어뜨린다
정부는 네이버클라우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 AI, LG AI연구원 등 5개 기업을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한 정예팀으로 선정했다. 이들은 오는 2027년까지 최종 2곳으로 압축될 예정이며, 한국형 초거대 AI 모델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정예팀은 AI 기본법의 규제 조항—특히 "고영향 AI 기준의 모호함과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가 기술 개발과 서비스 운영에 심각한 제약을 준다고 지적한다. 한 정예팀 관계자는 “토종 기업들은 시작부터 규제 조항을 고려해야 해 성능 고도화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고영향 AI 기준, 누구를 위한 정의인가
AI 기본법 제2조 4항은 ‘고영향 AI’를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으로 정의한다. 문제는 이 정의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대부분의 AI 모델이 고영향 AI로 간주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이에 따라 정예팀들은 기업 규모, 업종, 위험도에 따라 단계적 차등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세분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워터마크 의무화, 사용자 경험 훼손 우려
AI 기본법은 생성형 AI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음성, 이미지, 영상 등 실시간 반응과 몰입이 중요한 콘텐츠 제작에 장애 요소가 된다는 지적이다. 한 정예팀은 “2027년에도 워터마크 의무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에 기술적 제약이 생긴다”고 밝혔다.
규제보다 진흥이 먼저다
AI 기본법은 산업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정부 중심의 규제 프레임으로 설계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 필요한 것은 ‘선 진흥, 후 규제’ 원칙”이라며,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전문가들은 법 시행을 3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기술 흐름에 맞춘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국회에서는 황정아 의원이 발의한 3년 유예 법안이 심사 중이며, 정부는 이달 중 시행령을 공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