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노인은 없다”…새 시대 ‘영 시니어’가 바꾸는 고령화의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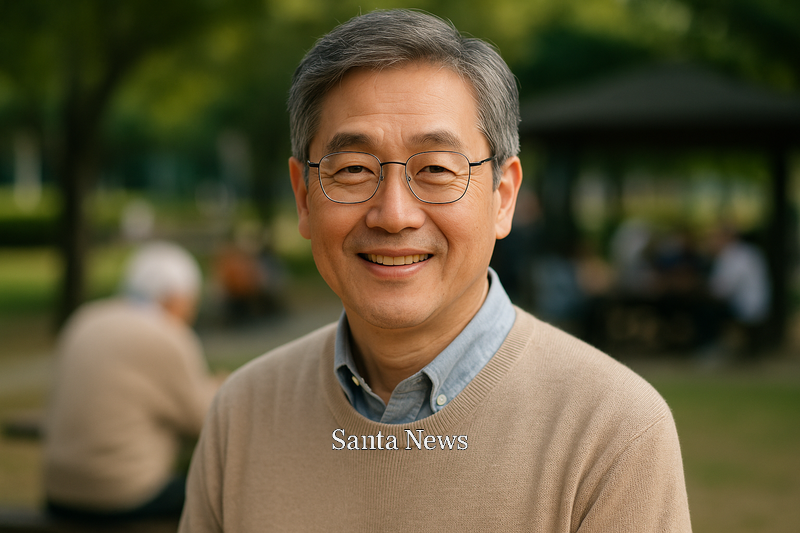
“지금의 65세는 더 이상 ‘노인’이 아닙니다.”
싱가포르경영대(SMU) 성공적노화를위한연구소(ROSA) 소장인 폴린 스트론 교수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새롭게 은퇴를 맞은 세대는 과거의 노인과 다르다”며, “이들이 사회에 계속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트론 교수가 이끄는 ROSA는 2015년부터 50~70세 싱가포르인 1만2000명을 장기 추적하는 ‘싱가포르 생애 패널(SLP)’을 운영하며 초고령화 사회의 정책 방향을 연구해왔다. 싱가포르의 고령화율은 지난해 6월 기준 19.9%, 한국은 지난해 12월 20%를 돌파하며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 “노년을 약자가 아닌 자원으로 보라”
스트론 교수는 아시아 사회의 오랜 편견을 지적했다.
“많은 사람들이 노인을 ‘돌봄이 필요한 존재’로만 봅니다. 하지만 지금의 60~70대는 부모 세대보다 더 잘 교육받았고, 경제적 기반도 탄탄하며 여전히 건강합니다.”
그녀는 노년층을 사회의 짐이 아닌 **‘활동적 인적 자원’**으로 보는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금 65세에 은퇴한다고 해도, 평균 기대수명 85세를 고려하면 20년 가까운 시간이 남습니다. 그 기간을 단순히 ‘노년’으로만 부를 수 있을까요?”
■ 건강한 노화, 사회적 기여의 첫걸음
싱가포르는 건강 수명 연장을 핵심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싱가포르의 건강 수명과 평균 수명은 약 10년의 격차가 있습니다. 이 10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정부는 ‘더 건강한 싱가포르(Healthier SG)’ 프로그램을 통해 만 40세 이상 국민이 주치의를 배정받고, 3개월마다 운동·식습관·수면 등 생활 습관을 관리하도록 돕고 있다. 이 제도는 개인의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사회 전체의 의료비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 “일하지 않아도 ‘보이는 존재’여야 한다”
스트론 교수는 일자리뿐 아니라 ‘참여의 자리’를 강조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일을 멈추는 순간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인구의 4분의 1이 그런 사람으로 남는 건 어리석은 일이죠.”
그 대안으로 그는 유급 자원봉사를 제안했다.
“노인이 가진 기술과 경험은 귀중합니다. 이들이 소정의 보수를 받고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한다면, 사회적 가치와 개인의 자존감이 함께 높아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노인이 이웃의 아이를 돌보거나 또 다른 노인을 돕는 식이다. 그렇게 지역 안에서 ‘이웃이 서로를 돌보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정부는 진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더 집중할 수 있다.
■ “늙어도, 내 동네에서 함께 살아야 한다”
싱가포르는 좁은 국토 탓에 대형 요양시설을 세우기 어렵다.
그래서 정부는 “노인이 집에서 살고 죽을 수 있는 사회”를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10분 생활권’을 조성해 병원·슈퍼·공원 등이 걸어서 닿는 거리에 있고, 주민이 함께 운동하고 식사하는 ‘커뮤니티 스페이스’를 늘리고 있다.
“같은 동네 사람들이 함께 늙어간다는 건 큰 위안이 됩니다. 그 안에서 관계가 유지되면, 노화는 더 이상 고립이 아닌 ‘함께 사는 과정’이 되죠.”
■ “고령화는 위기가 아니라, 두 번째 봄이다”
스트론 교수는 인터뷰 말미에 이렇게 덧붙였다.
“고령화는 피해야 할 재앙이 아니라, 잘 설계하면 새로운 가능성입니다. 지금의 영 시니어들은 자신이 쌓아온 경험을 사회에 되돌려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단지 무대를 마련해주면 됩니다.”
그녀의 말처럼, 초고령 사회의 진짜 변화는 ‘몇 살을 노인이라 부를 것인가’가 아니라, ‘나이 든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묻는 데서 시작된다.
